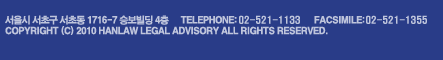1. 기존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측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임대인과 건물소유자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2. 이에 저희 법인은 임대인 등을 대리해, 우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등의 규정은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,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채권적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지,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.
또한,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‘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’와 그 의무 위반시 ‘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’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일 뿐, 나아가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요구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, 임대차계약 체결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아울러,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신설취지 등 여러 논거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, 즉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 최장 5년의 기간 내에서 상가에 투입한 자본과 영업이익을 회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.
3. 그 결과 재판부는 임대인 측을 대리한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의 본소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한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하라는 임대인의 반소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. 이 사건은 최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신설로 이를 무차별적으로 악용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의 해석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담당변호사 홍임석, 김용호